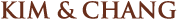|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처분의 요건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공기관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그러한 ‘염려만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법은 제한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반드시’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법 시행규칙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든,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의 위와 같은 규정의 차이에 주목하고, 공공기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법 시행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부정하여,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본 사안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법률규정에 대한 법리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향후 공공기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